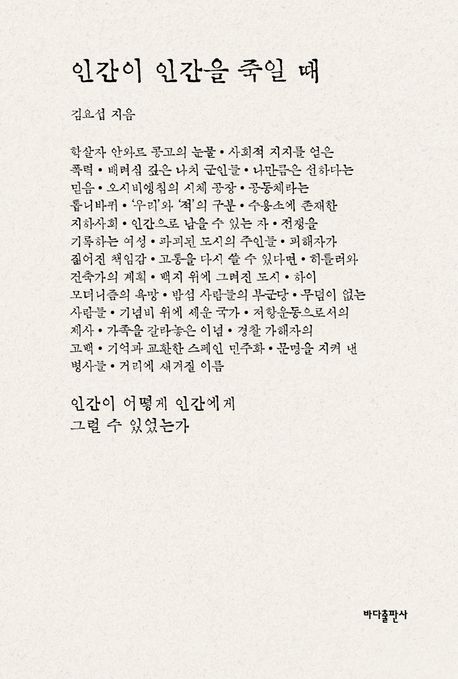‘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방인이나 소수자가 아니라 환영받고 존중받는 구성원이 되길 바란다’고 한다.
책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집단학살의 과정이 얼마나 비논리적으로 이뤄졌는지, 거기에 동화되거나 동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때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상세하게 듣는 일은 당연히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지만 도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거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얼마나 공감해야하나 고민하게 되는 책이었다.
당시 집단학살에 가세한 사람 중에는 의외로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 한다. 동료들이 업무에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낄 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료들이 덜 힘들어하기를,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랐다. 그 일을 단순히 업무로 생각하면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운영하느냐 생각하는 데 집중하면 다른 쪽의 판단은 쉽게 무시될 수 있다 한다. 그런 방식으로 중요한 걸 숨기고 다른 수치로,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합리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같은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쉽게 죽일 수 있을까 상상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혹은 인정받기 위해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 조금은 찔리는 부분이 있다. 내 인생에서도, 내가 있는 조직에서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되는 것을 추구해왔던 건 사실이다. 그게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라면 의심할 수 있었을까? 혹은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아주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는 건 그런 가해자들과 공유하는 점이 있다는 뜻일거다. 나도 내 판단이 미치는 영향과 거리를 두면 편하지만 그만큼 무감각해지기 쉽다. 그들이 괴물이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 것 같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고, 나도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결백하지만은 않다.
모든 판단을 긴장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