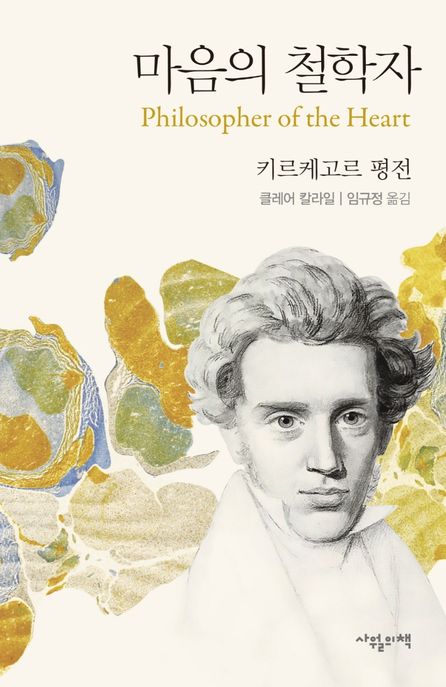‘신 앞에 선 단독자(single individual)‘란, 개인이 신과의 관계에서 고유한 존재로서의 자아를 성찰하고, 그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절대자를 앞에 두고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진정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기대, 제도, 군중, 심지어 합리을 초월하고 절대자 앞에 단독자로서 서야 한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죄, 반복, 절망, 순간의 네 가지 키워드로 이러한 철학을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죄는 도덕적 혹은 사회적 잘못이 아닌, 신 앞에서 자아가 느끼는 죄의식이다. 신과 자아 사이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인간은 고뇌와 불안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실존적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죄는 신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절망의 상태이며, 키르케고르는 이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불렀다.
죄에 빠진 사람은 벗어나지 않는 한 죄의 행위를 반복하게 되며,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반복적으로 신을 부정하며 살아간다. 믿음 역시 단회적 사건이 아닌 반복적인 고백과 실천을 통해 굳어진다. 이는 자아가 스스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한 방식이며, 신앙은 반복을 통해 주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자아가 절대자와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이는 실존의 핵심 정서이며 질병이다. 절망은 자아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거나, 되기를 포기할 때 발생하는 실존의 왜곡된 상태다. 그는 절망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 비-본래적 절망: 자아가 정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속에 몰입한 상태
- 소극적 절망: 자기가 영원성과 관계를 맺어야 함을 알지만 회피하는 상태
- 적극적 절망: 신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상태
이러한 절망은 자아의 형성과 구원 가능성을 가로막는 실존적 죄이다. 그리고 이에 벗어나 영원성과 접촉하는, 즉 회개하고 깨닫는 순간이 (종교 진리가 영원하다는 사실과 별개로) 개인에게 의미있다고 말한다.
무신론자로서 키르케고르의 주장과 삶을 알게 되며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그가 의심 없는 신앙을 비판했다는 점이었다. 정말로 신을 믿는 사람은 동시에 의심을 품고 있어야 한다, 의심은 증거를 따지는 인간 사고의 이성적인 부분이기에 의심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다.
기독교 교리는 본질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며 그 진리에 객관적 확실성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무언가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일 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직접 보고 만진 후에 연필이나 책상이 있다고 믿는 것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다. 신앙, 즉 신을 믿고 믿음을 가지는 일은,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으며 신에게 접근할 수 없어도, 여전히 신을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행위가 실존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결론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거라 생각한다. 결국 신앙이든 아니든, 자신에게 정직한 방식으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 그런 점에서 사르트르, 카뮈 같은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가들 보다도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더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철학자의 평전을 읽어본 것은 처음인데, 키르케고르의 철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리되었는지를 따라갈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