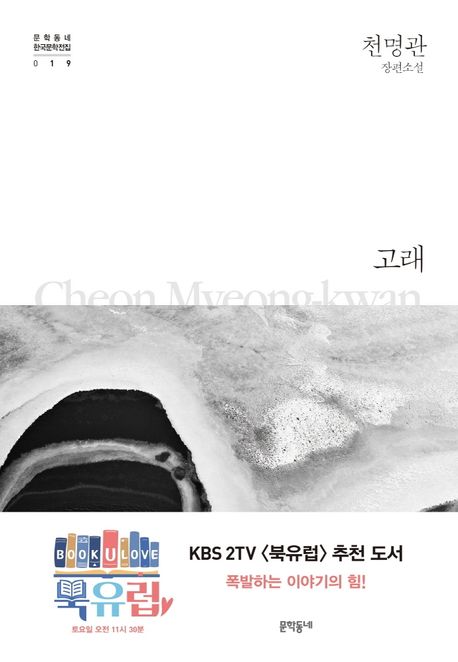부단히 타자를 향하는 리비도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초월하여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회귀하는 노파와 금복의 이야기는 다분히 초역사적이며 차라리 알레고리에 가깝다. 수십 년에 걸친 그녀들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자유자재로 서술하는 달변 역시 다분히 구술적이다.
천명관 작가 고래의 문학동네 판본에는 해설이 함께 실려있다. 해당 해설 중에 있는 위 구절이 고래라는 소설을 설명하는 제일 간결하고 확실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타자에 대한 리비도 때문에 여러 사건을 겪은 후 금복은 그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사업에 집중하며 남성성을 지니게 되고, 결국 좋지 못한 결말을 맞는다. 그리고 금복 이후의 이야기를 잇는 금복의 딸 춘희는,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는 금복과 다르게 내면에 몰입하고 스스로의 세계를 더 풍성하게 구축한다. 그리고 춘희도 그녀 나름의 마지막을 맞는다.
끝까지 읽고 난 후 마음에 남는 건 춘희였다.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 일들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며 그 과정을 겪어내는 춘희라는 인물이 기억에 남았다. 중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도 같은 생각을 했다.
이 책에서 성별에 대해 다루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지는 납득간다. 외설스러운 표현이 많아 부정적으로 생각할 소지도 있지만 인간의 바닥에 있는 끈질김과 본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는 이해된다. ‘이야기의 힘이 강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소설이다. 표현의 질 때문에 단순하다고 하기에는 강렬한 여운이 남는 것 같다.
진짜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여러 의미로 독보적이라 인상깊은 책이었다.